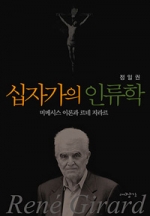 십자가의 인류학/정일권/대장간/고경태 편집위원
십자가의 인류학/정일권/대장간/고경태 편집위원‘십자가’는 기독교 핵심 가치인데, 십자가에 ‘인류학’이 첨가된 저술, <십자가의 인류학>다. 기독교 이해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유익한 저술이다.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느가 ‘십자가’를 인류 근원 매카니즘을 밝히며, 기독교의 독특한 십자가 사상을 제시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신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연계해서 자기 사상을 구축했다. 정일권은 그 과정을 모두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기독교 신학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증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다. 정일권은 지라르의 십자가 제시가 문화 코드이지만, 포스트모던 사회(종교다원주의)에 대항하는 좋은 사고 체계로 제안하고 있다.
정일권은 르네 지라르가 하이데거, 니체, 데리다가 주도하는 해체주의 현대 철학에 정면으로 대립한 사고 체계를 확립했다고 제시했다. 지라르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은 모두 그에 관해서 글을 썼다. 필립 얀시, 앨리스터 맥그래스, 본 발타자, 부르스마, 후드 등 수 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독자는 수 많은 저자 이름 숲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때 길을 잃음에 놀라지 말고, 숲의 웅장함에 경탄하면 된다. 책을 덮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지라르와 연계해서 수 많은 연구자들이 학문을 펼쳤다. 정일권은 지라르의 사상의 영향으로 로마 교회 신학자 칼 라아너가 종교다원주의 색체를 약화시켰다고 제시했다. 르네 지라르가 갖는 위력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라르와 바르트의 연결 부분에서 유사성을 언급하는 연구물들을 소개했다. 본 발타자, 토렌스의 협력 연구 등을 통해서 바르트와 지라르를 사상의 연속성으로 밝히려는 것을 제시했다. 필자는 바르트가 종교다원주의를 개방한 위대한(?)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지라르와 유사성을 개진하는 연구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십자가의 인류학>은 독자가 접하기 쉽지 않은 도서이다. 그럼에도 서평으로 독자에게 독서를 권하는 것은 ‘순수 학문의 위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의 심장을 울린 순수 학문의 위용이 지라르에게 있고, 그 위용은 한국 청년 신학도의 방향을 바꾸기까지 했다. 르네 지라르를 보면서 ‘순수 학문’이 가능함을 보여준 실례라고 추천하고 싶다. 순수 학문은 1급 학문이다. 1급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의 인류학>의 독서의 난점은 많은 신학자들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이다. 저자가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는 ‘초석’, ‘환대’라고 보았다. 르네 지라르의 용어는 ‘미메시스 이론’이다. 지라르의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 <십자가의 인류학>에서는 미메시스를 근거로 희생양, 폭력, 인신공양 등이 등장한다. ‘미메시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방이론’이고,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구도화시킨다. 이런 독특한 용어들을 체킹하면서 독서 노트를 만들어 용어들을 체득한다면 관점이 확장되며 놀라운 지식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형벌적 대속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졌다. 그런데 지라르가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속적 죽음을 ‘희생양’ 구도로 제안하며 거부했다.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다. 지라느는 십자가가 만족이나 대체가 아닌, 인간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평화라는 것이다. 희생양, 대속 제물 구도는 요 11:46-53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50절)라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이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할 때, ‘희생양적 죽음’인지를 분별하면 된다. 희생양은 Scapegoat로 아사셀(Azazel, scapegoat, 레 16장)이다. 필자는 ‘아사셀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십자가의 인류학>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도 기원탐구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수메르 문명 등 인류문화를 탐구하며, 우리 고대사도 활발하게 탐구하는 결과물이 속출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순수 학문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이 순수 학문에 관련한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기원문화를 탐구하면 풍성한 상상력과 문화코드 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된다. 순수 학문에 관련된 도서들이 독자들의 서가에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정일권의 두 권의 책을 서평하면서, 김모세의 <르네 지르라>(살림, 2008)라는 도서를 발견했다.
 신고
신고 인쇄
인쇄 스크랩
스크랩

